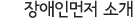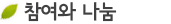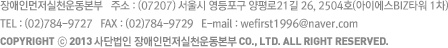- 제목
- 7차 '옆자리를 드립니다!' 참여후기
- 작성자
- 장애인먼저
- 작성일자
- 2014-09-04 11:37:28
- 조회수
- 3,133
나도 횡단보도 앞에서 장애인이다.
‘옆자리를 드립니다!’ 라니. 봉사활동 내용을 보고 맨 처음 든 생각은 ‘과연 그게 봉사가 될 수 있을까?’ 였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겪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같이 공연만 보는 활동은 처음이었다. 봉사라는 건 누군가를 돕는 일인데,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을 도우려면 최소한 복지관 청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래서인지 복지기관의 인력으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공공장소로 인솔하는 것 조차 어려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장애인분들은 그런 인솔에 있어서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았다. 내 파트너 황수영 언니는 별 다를 바 없는 내 또래의 청년이었다. 통성명을 하고 밝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내 의문은 싹트고 있었다. ‘도대체 공연 보러 가는 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걸까?’
수영 언니는 나보다 2살 많은 24살이었다.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니 카페에서 일을 하다 왔다고 했다. 나도 주말이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술술 풀렸다. 주문 받는 일에서부터 청소하는 일, 진상손님 뒷담화까지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흔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화가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남자 이야기가 나왔다. 키 크고 잘생긴 연하 남자는 진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뒤로도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백화점이 너무 복잡하다는 둥,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엄청 화려하다는 둥 소위 말하는 여자들의 시시콜콜한 수다들이었다. 수영 언니의 말은 조금 느리고, 때로는 더듬었으며,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때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와 수영언니만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들은 그들대로 그들만의 수다를 즐기고 있었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월드컵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영 언니는 리액션 크고, 활동적이고 수다스러운 내 성격을 칭찬했다. 쑥스러워서 다른 친구들은 말이 많다며 이런 내 성격을 흉본다고 하니 그래도 언니는 이런 내 성격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나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이런 웃고 떠드는 일이 수영 언니에게는 일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제야 수영 언니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언니는 나와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이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 보였다. 언니의 진심 어린 눈을 보고 이 봉사의 의미를 알았다.
한 인권 학술 모임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신호등의 신호가 건장한 성인 남성의 보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하체마비 장애인이 계단 앞에서 장애인이 되듯, 키가 작은 나는 횡단보도에서 내 평상시 보폭이 아닌 뜀박질을 요구 받는 장애인이 된다. 어쩌면 수영 언니에게 ‘소통’이라는 것이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의 빠른 말투가, 당연하다는 듯 소위 말하는 상식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이, 느릿느릿하고 더듬는 말투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 급한 성질이, 나아가 장애인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편견이 수영 언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니 봉사활동이라는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나는 수영 언니의 이러한 점을 못 참고 다른 대화 상대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처음에 ‘청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일이 ‘봉사’라는 특별한 활동인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생각이라는 걸 이번 봉사를 통해 깨달았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도움을 특별하게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태껏 그들을 너무나도 진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콘서트를 우리와 함께 보는 것, 소소하게 수다를 떨고 저녁식사를 즐기는 것을 그들에게 너무 큰 이벤트로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봉사라는 것을 깨달았다.